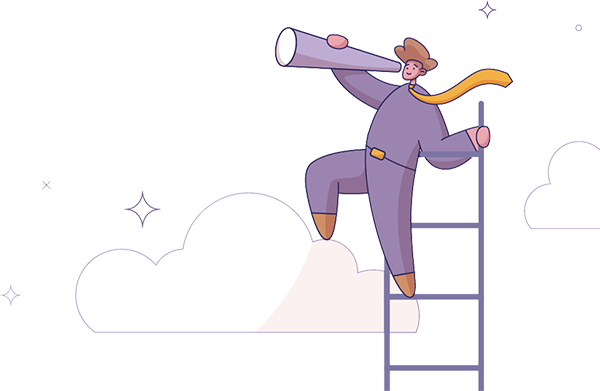상상은 자주 도망친다. 상상을 물고 오는 이야기의 뮤즈는 마치 속을 알 수 없는 고양이 같아서,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있을 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다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 위에 올라와 잠 못 들게 만들고는 한다. 게다가 상상은 언제나 휘발성이어서 흔적을 즉시 남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증발한다. 그래서 내 메모 앱은 늘 짧게 끄적거린 파편으로 넘친다. 극적인 장면이나 대사, 한 줄짜리 결말, 그럴듯한 제목, 무슨 생각으로 쓴 건지 기억나지 않는 500자짜리 줄거리 따위. 그리고 그중 무엇이 실제 이야기로 태어날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파편들을 메모장에 창고처럼 쌓아 둔다. 대부분은 오래 잠들어 있기만 한다. 메모를 쓸 때의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가끔 메모를 훑어보다 보면 마치 깨워 달라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처음 그 메모를 남겼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동력으로 삼아, 메모 속 문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먼저, 그 문장을 차분히 다시 읽는다. 방향을 알 수 없을 때는 문장의 시선을 따라 주변을 바라보고, 몇 가지 배경을 곁들여주며 그 문장이 숨 쉴 공간부터 마련한다. 단어 하나, 배경 하나, 인물 하나가 차례로 붙으며 세계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다. 이때 내가 하는 일은 세계를 ‘짓는’ 일이라기보다, 흩어지고 묻혀있던 세계의 뼈대를 찾고 재배치하는 일에 가깝다. 어디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맞춰진 적 없는 풍경의 퍼즐을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것처럼.
다음은 질문할 차례다. 이 사람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세계를 기울여 놓은 이 세계만의 원칙은 무엇일까? 그 원칙 속에서 가능-불가능-대가는 어떻게 나뉠까? 질문이 단서를 부르고, 단서가 구조를 만들고, 구조 위에 비로소 감정을 얹을 수 있다. 인물의 슬픔, 분노, 사랑, 두려움이 세계의 구조와 부딪히며 이야기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속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줄기는 며칠 만에 드러나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몇 달 몇 년씩 첫 문단 속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피어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그저 기다려 줄 수밖에 없다. 이야기 속 물리적 시간은 한순간일지라도, 그 한 장면을 ‘깨닫기’까지 인물과 작가가 느끼는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이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사이의 시간적 간극에 녹아들며 그 이야기만의 리듬과 호흡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의 호흡을 조절하는 건 결국 작가의 손끝이 아니라, 인물과 세계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시간 감각이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때로는 한참을 멈춰 서야 할 때도 있다. 이 세상 속 인물이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할까? 이 인물이 정말 원하는 선택일까? 그저 내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은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기는 하지만, 이런 고민이야말로 이야기 속 세상의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준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나오는 결정. 원칙이라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포탈을 열어 외계행성 타이탄에서 스파이더맨을 지구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면, 타노스를 블랙홀 주변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어야 하고, 핵폐기물 문제도 사라져야 한다 정도의 보편성일 뿐이다. 이 원칙은 상상력을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고 진실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뿌리가 된다. 나는 허구의 이야기일수록 원칙을 더욱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태도로 세계를 구축하면, 그 세계는 방도 문도 복도도 없이 외벽만 완성된 저택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누구도 그런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상상이 구현되는 세계에서만큼은 현실보다 더 엄격한 진실을 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상상 속 세계’라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쓰다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칫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도 하니까.상상은 때로 무섭기도 하다. 차갑고 먼 우주를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사라져도 별과 행성은 아무렇지 않겠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 끝에는 모순적인 따뜻함이 있다. 우리가 더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며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벅찬 고양감을 불러온다. 그래서 나는 종종 글이 기도문처럼 느껴지곤 한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조용히 반복하는 기도. 우주의 대답은 결코 돌아오지 않지만, 묻는 행위 자체가 이야기 속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나오고 나면,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 끝에 도달한다. 이야기를 마친다는 것은, 그 인물들과 그저 작별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을 놓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내게서 떠나가 독립적인 세계로서 존재하며 독자들에게 닿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그리고 나는 또다시, 다음 고양이가 새로운 상상을 물고 오기를 기다린다.

 이벤트
이벤트  독자의견
독자의견  웹진구독신청
웹진구독신청  이전호 보기
이전호 보기  독자의견
독자의견  구독신청
구독신청  이전호 보기
이전호 보기